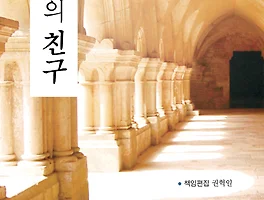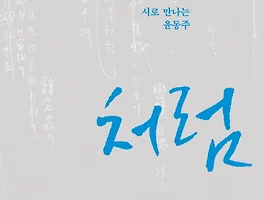'목사들의 목사'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선물
[서평] 유진 피터슨 <물총새에 불이 붙듯>(복있는사람)
"유진 피터슨은 '목사'였다."
이것은 3년 6개월 전 몬태나주에 있는 그의 자택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적어 본 방문기의 첫 문장이다. 그랬다. 피터슨은 영성신학을 가르친 교수이기도 하고, 성경 번역자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해 온 모든 일을 언제나 "목사로서" 한 일들이라고 고백한다. 그날도 그랬다. <메시지>(복있는사람) 성경 한국어판 완역 기념 인터뷰를 위한 만남이었는데, 인터뷰 중에도, 또 인터뷰 전후 대화에서도, 그가 말할 때의 작은 떨림에서마저 느껴졌던 단어는, '영성'도 <메시지>도 그 무엇도 아닌 '목사'였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목사 됨의 영광과 그 무게에 대하여 그처럼 눈빛을 반짝거리며 말하는 목사를 지금까지 만나 보지 못한 것 같다고.
그날 대화 중 피터슨은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 저서가 될 것 같은 책의 원고를 며칠 전 출판사에 넘겼다고 했다. 미국에서 작년 5월 출간되었고 이번에 복있는사람 출판사에서 역간한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 바로 그 책이다. '말씀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길에 관한 대화'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피터슨이 1962년 개척하여 29년간 목회한 '그리스도우리왕장로교회' 강단에서 전한 설교들 가운데 마흔아홉 개를 선별하여 엮은 것으로, 일곱 세트에 각각 일곱 설교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책이 설교 모음집이라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교는 '목사'의 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설교들은 '목사' 피터슨의 '마지막 말'(last words)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들 말이다.
유진 피터슨의 저작을 즐겨 읽어 온 독자라면, 이 책을 펼쳐 읽어 보고서 금세 알게 된다. 그동안 피터슨이 해 온 모든 말은 그의 이런 설교들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고, 또 이런 설교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피터슨의 영성에서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일치'(congruence)를 떠올릴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설교와 그의 신학은 '일치'한다. 그에게 설교는 신학함(theologieren)이었고, 그에게 신학은 영혼을 돌보는 일(care of the soul)이었다. 그의 신학과 설교의 일치는, 그가 추구한 더 큰 맥락의 일치, 존재와 일의 일치의 한 양상이다. 피터슨은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말"인 신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로 바꾸는 것이 설교가 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피터슨의 설교는 그래서 '설교'가 아니다. "내게 설교하지 마!"라고 할 때의 그 '설교' 말이다. 그 '설교'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다. 훈계, 선동, 과시, 계몽, 세뇌의 말들, 겁주고 흥분시키는 웅변들, 그 뻔한 소리, 잔소리, 하나 마나 한 소리, 시시한 소리들 말이다. 무엇보다 피터슨의 설교는 우리를 '성서의 세계' 안으로 들이는 설교다. 그 "낯설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말이다. 피터슨 목사는 많은 이가 성경을 '사랑'하도록 도왔다. 경이에서 비롯하는 사랑, '두렵고 떨림'이 따르는 사랑 말이다. 성서라는 그 드넓고 현묘한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은, 성서가 이 세상의 일부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성서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 피터슨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와 보게 되는 세상은 얼마나 다른지! <물총새에 불이 붙듯>에 있는 설교들은 요즘의 흔한 설교들처럼 우리보고 달라지라고 닦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세상이 달리 보이게 만들어 준다. 성서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깊이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달리 보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책 제목 <물총새에 불이 붙듯>은 예수회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제라드 맨리 홉킨스(1844~1889)의 시구다.
물총새에 불이 붙고, 잠자리 날개가 빛과 하나 되듯,
우물 안으로 굴러든 돌이 울리고,
켜진 현들이 저마다 말하고, 흔들리는 종이
자신의 소리를 널리 퍼뜨리듯,
모든 피조물은 한 가지 같은 일을 한다.
각자 내면에 거주하는 제 존재를 밖으로 내보낸다.
자기 스스로를 발현한다. 그것이 '나'라고 명시한다.
'내가 하는 것이 나이며, 그 때문에 내가 왔다'고 외친다.
더 있다. 의로우신 그분은 의를 행하고,
은혜도 지키시니 그 모든 행위가 은혜롭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수만 곳을 다니시며,
아름답게 노니시기 때문이다. 자기 눈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아버지에게 아름답게. (18쪽)
_제라드 맨리 홉킨스, As Kingfishers Catch Fire, Dragonflies Draw Flame
"물총새에 불이 붙듯"은 가히 피터슨의 목회 일생과 영성 여정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는 시의 첫 구절로, 피터슨의 '마지막 말'의 제사(epigraph)로 더없이 딱 맞는 글귀다. 피터슨은 추구했다. 물총새가 날 때 제 빛깔―불붙은 듯한!―을 내고, 돌이 구르고 현이 켜지고 종이 울릴 때 각기 제소리를 내듯, 각 존재의 하는 일이 곧 그 존재의 발현인 경지, "일치"의 경지 말이다. 존재와 일의 일치를 추구했던 피터슨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그가 목사로서 하는 일의 일치를 추구했다. 그는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설교하고자 했다. "내가 하는 것이 나다"(What I do is me)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했다.
홉킨스의 시는 "내가 하는 것이 나"인 경지는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팎으로 "수만 곳을 다니시며/아름답게 노니시는" 경지라고 노래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경지인 것이다. <물총새에 불이 붙듯>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런 일치를 향한 소원을 불붙여 준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존재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삶이, 내가 일을 하고 삶을 사는 '방식'이 일치하기를 갈망하게 된다.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들 중 이보다 좋은 것이 있을까.
<물총새에 불이 붙듯>은 '목사들의 목사'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그는 주일 아침 예배 한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믿었고, 29년간을 그렇게 그 믿음대로 목양하고 설교하며 살았던 목사였다. '목사'의 말을 들어 보자.
이종태, <뉴스앤조이> 2018.06.29
'서평 > 고전의 벗들 (2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혼의 친구(유해룡 외) (0) | 2018.10.30 |
|---|---|
| 벌거벗은 지금(리처드 로어) (0) | 2017.09.07 |
| 예수처럼, 동주처럼 : 『처럼: 시로 만나는 윤동주』 (0) | 2016.09.23 |
|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0) | 2016.06.10 |
| [서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다 (0) | 2015.11.03 |